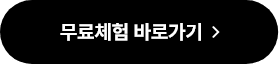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제니퍼 오브라이언은 미국 투슬로 중학교(Tuslaw Middle School) 교사다. 그는 대형마트 ‘타깃’(Target)에 놀러 갔다가 딸아이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루빅큐브 하나를 샀다. 나중엔 딸보다 본인이 큐브 놀이에 푹 빠졌다. 교실로 큐브 몇 개를 가져가 쉬는 시간마다 짬짬이 갖고 놀았다. 반 아이들이 이런 광경을 놓칠 리가 없다. 아이 몇 명이 큐브에 관심을 보여 시작한 큐브 소모임은 한 반을 넘어 학교 전체로 삽시간에 퍼졌다. 학습 속도는 빨랐다. 보통 큐브로는 성이 안 찬 아이들은 스피드큐브를 썼고, 완성 단계로 가는 자기만의 조합(combination)을 개발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기나 한다고 걱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큐브는 정규 과목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 아이들은 큐브를 맞추다 막히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했고 완성한 큐브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서로 공유했다. 오브라이언은 “애들이 각종 콤비네이션을 금세 배우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수학, 과학 실력뿐 아니라 협동심, 단계별 과정 학습, 문제 해결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까지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이 몰라서 그렇지 큐브는 원래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1974년 헝가리의 에르노 루빅 교수가 발명한 루빅큐브는 1980년 미국으로 넘어와 창의력을 길러 주고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하는 ‘도구’로 큰 인기를 끌었다. 놀면서 배우게 하는 교보재인 셈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딩도 큐브와 비슷한 면이 많다.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와중에 다양한 능력이 향상된다. MIT 미디어랩 교수인 미첼 레스닉은 그의 저서 <미첼 레스닉의 평생유치원>에서 “코딩을 배우면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고 주장했다. “코딩을 하면 복잡한 문제 하나를 단순한 여러 문제의 조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계속해서 개량하고 개선하는 컴퓨팅적(Computational Thinking) 사고도 기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코딩에도 협업은 필수다. 코딩 도구 ‘스크래치’에 공유버튼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걸 누르면 대화형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스크래치가 개발된 후 10년 동안 2,000만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게시됐다고 한다. 같은 흥미를 지닌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다. 미첼 레스닉은 “공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부딪힐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회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미첼 레스닉의 말을 들어 보면 코딩은 영양분을 골고루 갖춘 완전식품이다. 이것만 하면 미래 역량이 줄줄이 따라올 것 같다. 다만,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코딩을 한다고 자동으로 미래 역량이 길러지진 않는다. 오브라이언이 큐브 수업을 열고, 각 면을 한 색으로 맞추는 법을 일일이 지도했다면 결과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누가 시키기 전에 아이 본인이 흥미를 느껴야 한다. 큐브 돌리듯 코딩 프로그램을 이리저리 돌려 보며, 스스로 고민해 봐야 문제해결력이 싹튼다. 해법과 결과물을 친구와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의사소통능력이 함양된다. 혼자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코딩 스킬은 배울 수 있어도 역량은 기를 수 없다. 큐브 놀이의 목적이 큐브를 빨리 맞추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듯, 코딩 교육은 코딩 전문가를 목표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오브라이언의 큐브 수업은 국내 코딩 교육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